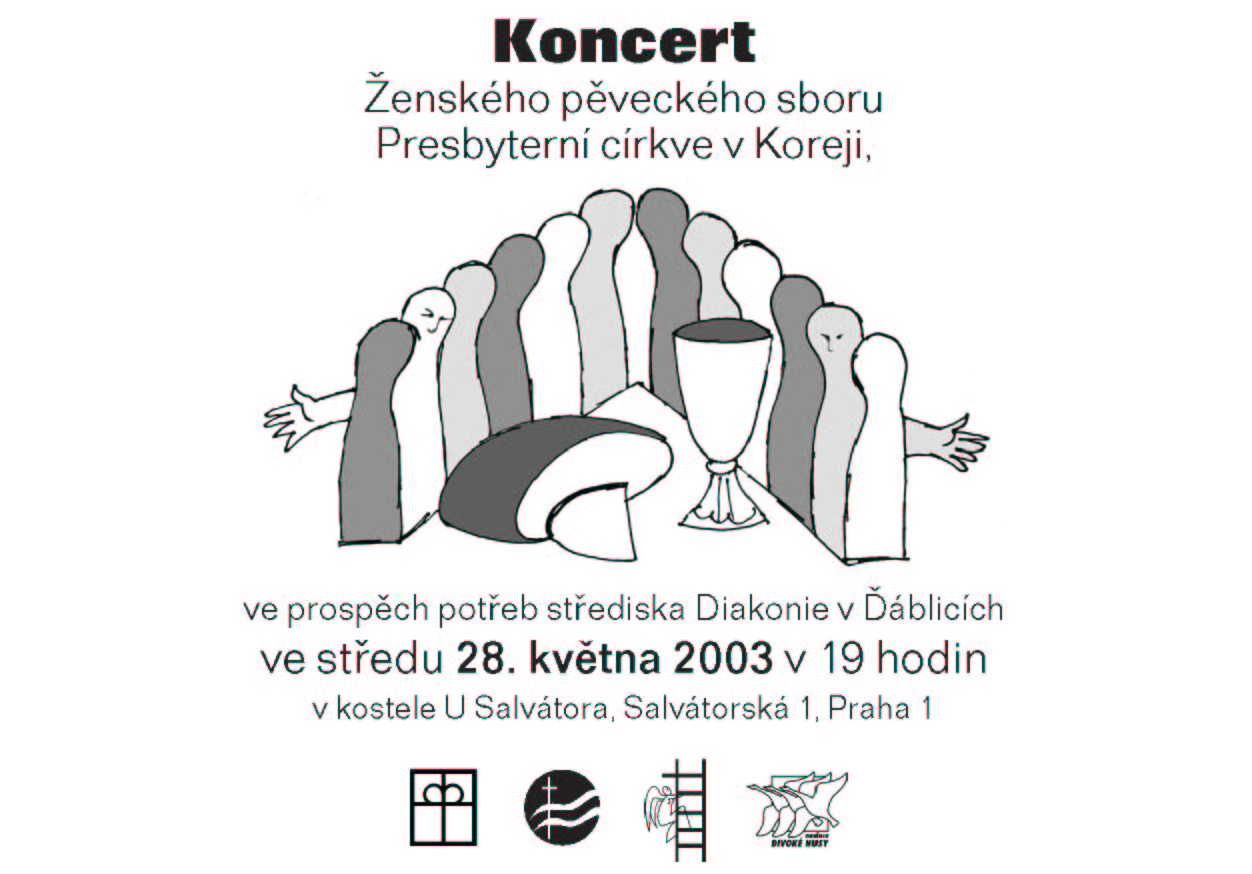- 연합 예배 (2003년 06월 01일)
- 출 16:1-15
- 설교자: 이종실
030601ek
본문: 출 16,1-15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이월 십오일이라
2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4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 제 육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찌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7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관대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8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14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설교>
부활의 승리의 기쁨은 언제나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승천으로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다시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번져갑니다.
그들은 교회의 전통에서 읽혀지는 요한복음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닥쳐올 박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 편안함과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3절)
지금 원망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원망하는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출 2:23)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유하게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해방시킨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던 날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 이월 십오일이라 (1절)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이제 꼭 한 달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한달 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할 때에 그들 앞에 나타난 홍해바다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막다른 길을 뚫어 계속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절망을 뚫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찬양하였습니다.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들은 주님께 노래하였습니다.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 15:1-2)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캠프를 친 곳은 샘물 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 둘과 종려 칠십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출 15:27)
광야에서 이보다 더 좋은 캠프장소는 없습니다.
그 장소를 그들이 스스로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장소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다시말씀드려 주님이 그들을 샘물로 인도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풍성함이 넘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원망을 하였을 때 그들은 그와 같은 체험들을 하였을 때였습니다.
샘물로 목마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입으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교회의 발걸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자신의 매일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와 비슷한 배은방덕하고 부끄러운 사고방식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아침 예배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고 주의 만찬의 샘물 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배를 마치고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8절)
주님은 분명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은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망할 때마다 주님이 그 원망도 들으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8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면 좋았을 것을 말한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계속 살리십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것이 사실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날아와 장막 주변을 덮었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장막에 내리고 그리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세미한 것으로 덮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양에서 여행한 40년 동안 그들은 이 하늘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대로 그들은 의롭고 경건하고 신실한 백성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상태는 애굽에 있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양식을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지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오직 은혜때문이지 은혜이외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혀 가치 없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은총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2절에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위를 만족하기 위해 양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은 녀희가 내가 주 너의 하나님임을 알게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줄 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은혜가 넘치는 여호와와 생명의 관계로 살게 되어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두려워 함으로 그를 신뢰함으로 그를 따름으로 살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거기서 양식을 주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광야로 인도되지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없이 교만한 인간이 그들을 진실한 삶으로 해방시키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신명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하려
하심이니라 (신 8:2-3)
매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이유가 그들은 양식으로 단지 살게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매일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단지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복종할 명령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만나를 저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각 사람의 식량대로 거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양식 그 자체가 아니라 양식을 주는 분 그 분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날마다 복종하며 그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참된 삶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치도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지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광야의 여행은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위해 겪어야만 하는 커리큘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을 성장케하고 훈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광야의 여행을 통해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 광야의 여행 길을 우리 홀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